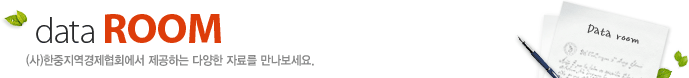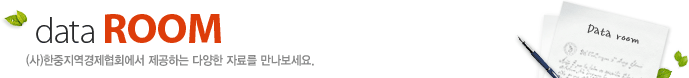[기타] "제3차 중국 붐이 시작되고 있다"
|
|
 최고관리자
최고관리자
13-11-06 10:42
|
|
우리는 두 차례의 ‘중국 붐(boom)’을 경험했다. 한·중 수교 원년인 1992년부터 97년까지 진행된 1차 붐에 이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제2차 붐을 누렸다. 1차 때 양국 교역량은 연평균 약 32% 증가했고, 2차 때는 33%나 늘었다.
또 다시 붐이 일 조짐이다. 동인은 양국 간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협정 체결과 함께 양국 간 문턱이 낮아지면서 투자와 무역은 다시 급증할 것이다. 이르면 내년, 늦어도 후년부터 현실화될 제3차 중국 붐이다. 그러나 그 속성은 지난 1, 2차 때와는 분명 다를 것이다. 어떻게 다를 것인가? 답을 알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꿰뚫어 봐야 한다. 그래야 3차 붐의 속성을 알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발전 ‘버전’을 보자. 1949년 건국과 함께 시작된 마오쩌둥(毛澤東)의 30년 치세(治世)는 ‘차이나1.
0’의 시기였다. 마오(毛)는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발전을 계급투쟁으로 봤다. 그렇게 시작된 게 대약진 운동이었고, 수천만 명이 굶어죽고 나서야 모험은 끝났다. 대약진 운동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잠시 물러났던 마오가 권력을 되찾는 과정에서 터진 게 바로 중국 사회를 10년 동안이나 갈가리 찢어놓은 문화대혁명이었다. ’차이나1.0’을 투쟁의 시기로 부르는 이유다.
덩샤오핑(鄧小平)이 열고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이어받은 ‘차이나2.0’ 버전은 제조의 시기였다. 덩(鄧)은 경제를 계급투쟁이 아닌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봤다. 농촌과 도시 뒷골목에서 빈둥대던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끌어냈다. 2001년 WTO가입으로 이들 4억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서방 경제시스템으로 편입됐다. ‘세계 공장’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이 ‘차이나2.0’의 성적표다.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의 등장으로 중국은 ‘차이나3.0’ 버전으로 진입하게 된다. 빈부격차, 공급과잉, 지방정부 부채 등 새 지도부가 직면한 경제 현실은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아 보인다. ‘성장만이 살 길이다’며 달려온 ‘2.0’시기에 잉태됐던 고질이다. 문제의 밑바닥에 ‘3개 균형의 상실(三個失衡)’이 있다. 성장은 지나치게 투자에 의존하고 있고, 기업은 내수보다는 해외 시장에 기대고 있다. 국유체제가 부를 독점하면서 민간 부문은 축 늘어졌다.
길은 외길, 개혁뿐이다. 경제 개혁의 총대를 멘 사람이 바로 ‘모든 발전은 개혁과 관련됐다(一切發展,都與改革相連)’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는 리커창 총리다. 그는 ‘3개 전변(三個轉變)’을 말한다. 투자가 아닌 소비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고,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산업고도화를 통해 투입의존형 성장 패턴을 탈피하겠다는 뜻이다. 3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재균형(再平衡·Rebalancing)’ 작업이다. ‘리코노믹스(Likonomics)’의 뼈대이기도 하다. 핵심은 소비다. 소비 시장을 키우지 않고는 ‘중진국의 함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3.0’ 시기에도 13억 인구는 여전히 중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러나 형질은 다를 것이다. 그동안의 인구가 ‘노동력(work force)’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다면 앞으로의 인구는 ‘구매력(purchasing power)’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리 총리는 더 많은 돈이 가계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있다. 임금이 매년 20% 안팎 오르는 이유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새로운 세계 중산층(The New Global Middle Clas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중산층이 2010년 약 1억5700만 명에서 2020년에는 6억7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의 절반 정도가 중산층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중국의 중산층 소비력은 전 세계 소비의 약 4%로 세계 7위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2020년에는 13%로 늘어나 미국을 제치고 1위 자리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많은 품목에서 ‘세계 최대 시장’을 자랑하고 있다.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소비품인 자동차의 경우 중국은 2009년 미국을 제치고 그 자리를 차지했다. 세계 최고 히트상품인 스마트폰 역시 올 2월 미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꿰찼다. 중국 소비는 한국으로도 넘쳐 흘러들어오기도 한다. 한 해 약 250만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 면세점 고가 브랜드 제품을 쓸어간다.
리코노믹스와 13억 구매력,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중국이 이제 ‘제조의 시기’에서 ‘소비의 시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차이나3.0의 핵심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조의 시기, 중국 비즈니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제품을 더 싸게 만드느냐’였다. 그게 ‘세계 공장’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3.0, 소비의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비싸게 팔지를 고민해야 한다. 중국 소비자와의 소통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중국에서도 브랜드가 중요하고, 디자인이 필요하고, 마케팅이 중시돼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제품을 중국 시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닌, 기획 단계부터 그들만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메이드 온리 포 차이나(Made only for China)다.
영상, 음악, 연극, 콘텐트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우리가 중국에 비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다. 창의력이 농축된 ‘문화상품’에 기회가 있다는 얘기다. CJ가 만든 한·중 합작영화 ‘이별계약(分手合約)’은 수 주 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중국인들의 눈물을 쏙 빼놨다. ‘난타’는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고, 비보이(B-Boy) 공연은 중국 젊은이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런 게 다 중국 비즈니스의 상품이 될 수 있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휴양과 오락, 카지노 등이 결합된 아시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만들어 중국 소비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신뢰도 상품이다. 한국에 온 관광객들은 면세점에 들러 수백만원짜리 시계를 쓸어담는다. 중국에 고급 시계가 있는데도 말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산 것은 단순한 시계가 아닌 ‘신뢰’라는 상품이다. 한국에서 사면 가짜가 아닐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지갑을 연다. ‘한국 식품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중국에서 한국 우유와 분유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먹거리뿐이 아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우리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신뢰를 담아 팔아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한국은 믿을 만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신뢰야말로 최고의 부가가치이기 때문이다.
한·중 FTA의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추진하는 한·중FTA를 통해 산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체결되면 우리는 미국·EU·중국 등 세계 3대 시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깔게 된다. 미국과 EU, 일본 등의 기업이 이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나라에 와 고급 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말이다. 우리에게는 중국이 갖고 있지 않는 자유시장 질서가 살아 있고, 고급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신뢰가 살아 있다. 여기에 중국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한국은 분명 서방 선진기업들의 중국 진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시장을 겨냥한 다국적 기업의 R&D센터를 서울로 끌어들이고,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본부를 인천으로 모아야 한다. 그러기에 더욱 협력적 노사관계, 공정거래 관행, 기업 중시 풍조 등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FTA 체결과 함께 시작될 제3차 중국 붐은 소비의 시기라는 ‘차이나3.0’의 흐름과 함께 올 것이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꼭 온다. 중국이 제조의 시기를 달려왔던 지난 21년, 우리가 세계 공장에서 기회를 잡았듯 말이다.
한우덕@Chindia Pl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