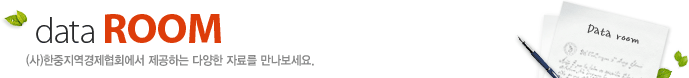일감 줄어 낮잠 임금 인상, 구인난 등 영업 환경 악화로 제조업 분야 임가공 투자 업체들이 퇴로를 모색하고 있다. 칭다오 셰청(協成)광학의 공장 여직원들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남는 시간에 낮잠을 자고 있다. 한때 2300명에 달했던 이 회사 직원들은 현재 47명에 불과하다. [칭다오=한우덕 기자]
일감 줄어 낮잠 임금 인상, 구인난 등 영업 환경 악화로 제조업 분야 임가공 투자 업체들이 퇴로를 모색하고 있다. 칭다오 셰청(協成)광학의 공장 여직원들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남는 시간에 낮잠을 자고 있다. 한때 2300명에 달했던 이 회사 직원들은 현재 47명에 불과하다. [칭다오=한우덕 기자]

‘셰청루’와 ‘공주의 만찬’. 두 사례는 한국과 중국 간 경제협력 구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국의 싼 인건비를 노리고 진출했던 제조업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임가공 업체들이 몰려들면서 칭다오에는 한때 한국기업이 약 3000개를 넘었지만 지금은 500여 개만 남았다. 상하이, 선전 등에서도 저임금에 의존했던 업체들은 퇴로를 찾고 있다. 반면 소비자를 겨냥한 서비스(상품)는 시장 개척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CJ그룹은 16개 도시에서 27개 CGV영화관(210개 스크린)을 운영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선수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중국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박사는 “투자에 의존했던 성장 방식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시진핑(習近平)시대 중국의 성장전략”이라며 “여기에 중산층 등장에 따른 소비 구매력 상승이 소비시장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의 큰 흐름이 ‘제조 시대’에서 ‘소비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형근 무역협회 상하이지부장은 “매년 20% 안팎에 달하는 임금 인상을 당해낼 외국 제조업체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중국에서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보다는 소비자와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상하이의 중심가인 푸저우루(福州路)에 자리 잡은 ‘미스터피자’. 문을 밀치고 들어가니 식탁 건너편 주방이 눈에 들어온다. 투명 유리 건너편에서 요리사들이 피자를 만들고 있었다. 가끔 피자 도우를 돌리는 ‘쇼’를 연출한다. 젊은이들은 신기한 듯, 휴대전화를 꺼내 연신 사진을 찍는다. 이 회사 류장현 부총경리는 “중국 소비자들도 이젠 위생 청결에 신경을 많이 쓴다”며 “그들에게 깨끗한 주방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마케팅”이라고 말했다. 2011년 3월 문을 연 이 매장은 월 평균 매출이 1억5000만원을 넘을 정도로 성황이다.
미스터피자는 신규 매장을 선정할 때 원칙이 하나 있다. 가급적 피자헛에 가까이 간다. 류 부총경리는 “소비자들에게 ‘당신들이 최고라 여기는 피자헛 맛과 비교해 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중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훠전자스(貨眞價實·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함)’가 소통의 매개라는 얘기다.
황재원 KOTRA베이징무역관 부관장은 ‘새로운 선수’의 기준으로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끼어들 수 있는 회사”를 꼽는다. 그는 “그동안 중국 업체들은 기술 수준이 낮아 핵심 부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왔지만, 기술 수준이 높아진 지금은 자국 내 업체로부터 제품을 조달하기 시작했다”며 “그 공급선에 파고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생산분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톈진(天津)의 서울반도체는 새 선수의 면모를 갖춘 대표적인 회사다. 2001년 현지에 진출한 이 회사는 톈진에서 생산한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을 베이징·시안(西安) 등에 공급한다. 초기에는 대부분 수출했으나 지금은 약 40%를 중국 내수 시장으로 돌렸다. 중국에서만 지난해 65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황승현 주칭다오 영사관 총영사는 “중국 정부도 앞으로 같은 값이면 첨단기술·IT·환경 등에 강점을 가진 기업의 투자를 원한다”며 "그들이 탐내는 기술을 가진 업체라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한우덕·조혜경·채승기 기자,
◆특별취재팀=한우덕·조혜경·채승기 기자,